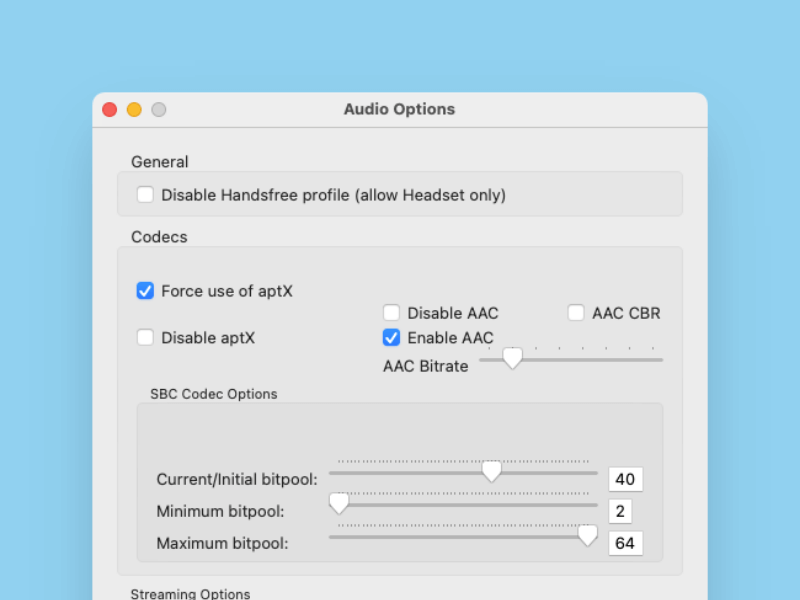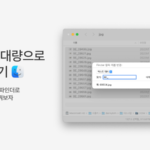사무실 밖으로 나오니 선선해진 가을의 밤공기가 도로 위를 가득 메웠다. 강남역 신분당선 지하철에 올라 노션을 켰다. 아이폰 12프로로 바꾼 지 일 년이 지나 13이 나왔는데 여태껏 소비의 흔적조차 끄적이지 않은 것을 보니 블로그에 무심했던 것이 확실하다. 글 수를 늘리고 싶지만 잉여시간이 없는 삶을 탓할 뿐이다. 매번 오랜만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더 많이 글을 쓰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창피해서 오늘은 그 말만은 하지 않겠다.
어느 교육 대기업의 영어 학습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의 PM과 기획을 맡으면서 지옥 같은 1년을 보냈다. 그 사이 진급을 하여 새로운 명함이 나왔고 회사는 판교에서 강남으로 이전을 했다. 새로운 자리의 등 뒤 창밖에는 유명 수입차 매장이 있어 가끔 눈을 돌려 신차와 내 자금 현실을 비교하기도 하고 동네 마트에 쇼핑 나온 듯 보이는 강남 고객들을 구경하곤 한다. 퇴사자와 입사자가 많아졌고 팀에는 인턴까지 들어왔다. 번지르르해 보이는 시기가 다시 온 것 같다. 지금 회사에 들어온 지도 40개월이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라진다는 말이 체감된다. 업무가 몸에 배어 긴장감은 사라졌고 깊게 쌓인 피로는 쉬이 풀리지 않는다. 내 업무에 동료들 업무 관리까지 하다 보니 어떤 날은 의자에 엉덩이 붙이기 어려운 날도 있다. 한숨 돌리기 위해 옥상으로 도망을 치기도 한다. 옥상 난간에 서서 도시 경치를 안주 삼아 연기 없는 담배 한 모금 마시다 보면 해마 구석에 숨어있던 잡생각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한다. ‘나도 IT 업계의 뻔한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입사 제의를 받고는 그럴싸한 미래가 올지 모른다는 기대를 하기도 한 적도 있지만 보통의 IT 기업의 PM, 기획자로 머물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잠시 지나가는 슬럼프겠지 하면서 옥상을 벗어났다. 한 계단 내려올수록 고민은 한 계단 올라간다. 퇴근 후, 낮에 했던 그 고민이 머릿속을 벗어나질 않고 있다.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 걸까.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슬쩍 암산을 해보았다. 음… 아내와 라면 하나 끓여먹고 싶어지는 밤이다.
요즘 면접이 많다. 면접은 공격과 수비가 난무한다. 지키지도 못할 “눈치 보지 않고 연차를…”, “뽑아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와 같이 지키지도 못할 말들 투성이다. 대체로 전반전 선공은 회사의 면접관이 담당한다. 공격적인 면접 전반전이 끝나면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라는 말과 함께 방어 태세를 갖추고 후반전이 시작된다. 익숙한 질문이 열에 아홉이다. 지난주 만난 어떤 지원자의 질문이 기억에 남았다. “직원 간에 호칭과 반말을 쓰시는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라며 물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숨을 들여마시고는 웃으며 대답을 시작했다. “음, 호칭은 보통의 회사처럼 성이나 이름에 직급을 붙여서 부르고 카카오처럼 영어 이름을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저는 모든 분들께 존댓말을 써요. 같이 일하게 되면 제가 이름을 부른다거나 반말을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지원자는 “네.”라는 짧은 답을 했다. 면접관은 나를 포함하여 세명이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나와 다르게 반말이 익숙하다. 이분들에게는 이 질문과 답변이 불편했을 수 있다. 팀 막내에게 존대하는 걸 탐탁치 않아 했던 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나를 따라주는 직원도 있다.
지위나 나이를 이용해 동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인격적인 공격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직원(근로자)은 회사와 계약 관계다. 직급은 역할의 차이이다. 아래 동료에게 반말을 하는 게, 화를 내는 게, 큰 소리를 치는 게 지위의 권한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다. 휴가를 못쓰게 하거나 눈치를 주는 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일장연설이 되고 있다. 마무리를 하자.
회사 내 중장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갈수록 싸늘하다. 젊은 세대에게 그들의 삶은 부정당하기 일쑤다. 자상하고 너그러운 이미지는 간 데 없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암호화된 표현으로 뒤에서 비하되고 있다. 그간 회사의 문화가 그래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해왔다 하더라도 달라진 시대를 인정해야 한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합리적인 꼰대가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언젠가 후배가 진심으로 라떼 좀 들려달라는 말 정도 들을 수 있도록.
모니터 너머 맞은편의 88년 굴렁쇠 디자이너가 “팀장님, 이거 보세요.”라며 닌텐도 게임보이를 내밀었다. 89년도에 출시된 흑백 LCD에 무려 스테레오 사운드를 갖춘 게임기다. 반가운 소닉 게임들이 들어있다. 둘 중 누가 더 나이 들은 건지 흑백 LCD가 흐릿해 보였다. 잡음도 심했다.
어릴 적 내 부모님은 대우전자 대리점을 하셨다. 그 덕에 대우 재믹스 게임기로 친구들 앞에서 어깨에 힘 좀 주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들고나갈 수 없으니 골목 담장 아래 쭈그려 앉아 게임을 할 수 있는 친구의 게임보이가 부럽기만 했었다. 잊고 있었던 추억들이 설렘과 낭만을 품은 신기루가 되어 잠시 머릿속을 스친다. 그 시절 즐겼던 무언가가 이제는 기억과 추억 즈음의 머나먼 이야기임을 자각하게 된다. 돌아갈 수 없지만 돌아갈 수 있다 해도 고민이 될 거다.